조선시대, 백성의 고통을 덜기 위한 최초의 여론조사
공법, 토지 비옥도․농사 풍흉에 따라 등급 나눠 과세
여론조사․시범시행 등 민주적인 절차 거쳐 공법 완성
[천지일보=백은영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났다. 선거철이 되면 선거홍보나 여론조사와 관련된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말 그대로 국민의 생각과 여론을 조사하는 행위다. 지금이야 통신수단이 발달해 간단하게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지만 600여년 전 조선시대에 여론조사가 행해졌다면 백성들의 생각을 어떻게 수집할 수 있었을까. 조선시대의 여론조사 혹은 국민투표의 현장을 소개한다.

◆ 세종, 국민 여론을 묻다
1430(세종 12)년,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른바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이다. 이 국민투표의 결과로 실시된 것이 바로 ‘공법’이다.
백성을 위한 공평한 과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대왕이 시행한 ‘공법’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개 등급(전분6등법), 농사의 풍흉에 따라 9개 등급(연분9등법)을 나누어 때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지는 제도다.
이 조세제도는 조선왕조 500년 조세제도의 기틀이 됐으며, 조선이 번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조선의 조세제도는 관리나 토지 주인이 직접 농작의 상황을 조사해 보고하면 작황의 손결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으나 매년 모든 백성의 작황을 살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관리들의 재량으로 매년 개별 토지의 수확량을 조사해 납부액을 결정하다보니 재량권을 가진 관리에게 향응을 대접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무엇보다 가난한 농민들이 부자들에 비해 과도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세종은 가난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관리와 토호 양반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과세법을 고민하게 됐고, 그 고민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 ‘공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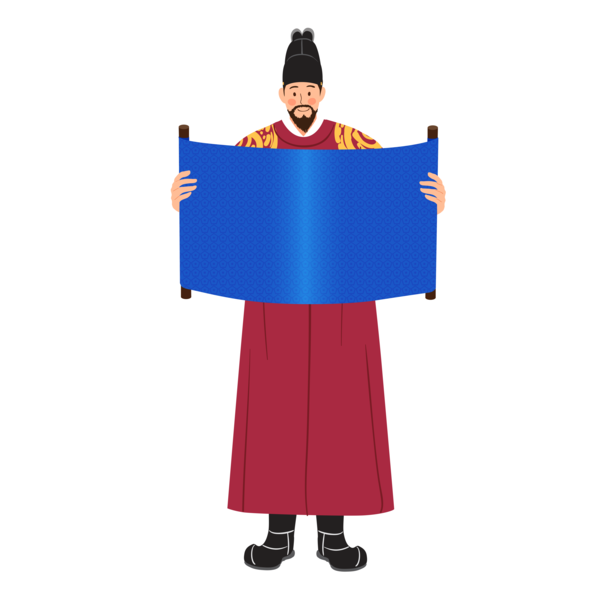
세종은 또한 평등하고 합리적인 세금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우선 과거 시험에 공법에 관한 문제를 출제해 젊은 유생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신하들과 치열한 토론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또한 정치권력부터 소외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공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장 5개월에 걸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벼슬아치에서부터 민가의 가난하고 비천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법에 대한 가부를 물어라. 만약 백성이 이 법이 좋지 않다고 하면 행할 수 없다.”
세종은 1428(세종 10)년부터 조세개혁을 구상, 1430(세종 12)년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토지 1결(結)에 쌀 10말(斗)을 받는 법안에 대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17만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과반을 기록했지만 비옥한 전라․경상 등에서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 몰표가, 척박한 평안․함길에서는 이와 맞먹는 반대 몰표가 나와 법안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조정 대신들의 반발과 여러 사정에 의해 공법은 바로 시행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조사, 시범 시행 등 민주주의의 초석을 보여줬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후 전제상정소를 설치해 1444(세종 26)년에야 ‘공법’이 마련됐고 같은 해 충청·전라·경상도 6개현에서 시범 실시한 이래 1489(성종 20년)년 함경도를 끝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렇듯 세종은 새로운 조세법을 실시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공법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후 지방 단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완점을 찾아가는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쳤다. 여론조사 이후 공법이 시행되기까지 무려 14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공평하고 정확하게 세금을 걷기 위한 세종의 모습에서 과연 대왕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다.
한편 ‘공법’ 시행을 위해서는 농사에 중요한 강우량 등 구체적인 측정 자료가 필요했는데 이때 ‘측우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