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무 89.2%·배추 65.3% 상승
석유류 1년 전보다 6.3% 올라
배달 수수료에 외식도 3.0%↑
신선식품 47개월 만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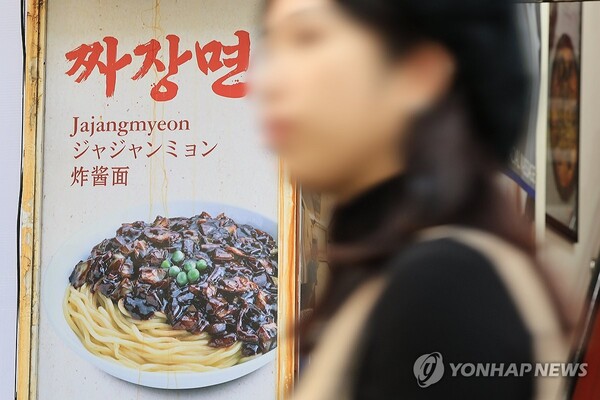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추, 무, 배, 당근 등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유류세 인하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의 가격도 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 물가 역시 1년 전보다 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6일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2월 소비자물가지수(116.08, 2020년=100)가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반등해 같은해 11월 1.5%, 12월 1.9%, 올해 1월 2.2%까지 치솟았다. 이후 지난달 2.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두 달 연속 2%대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품목성질별로 상품은 전년 동월 대비 1.9% 올랐다. 이 중 농축수산물은 1.0%, 공업제품은 2.0%, 전기·가스·수도는 3.1% 각각 상승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농산물은 1년 전보다 1.2% 떨어졌지만 채소류가 1.3% 상승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3.8%, 3.6%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무(89.2%), 배추(65.3%), 당근(59.6%) 배(21.9%), 귤(15.5%), 돼지고기(7.6%), 국산쇠고기(2.3%), 등의 가격이 치솟았다.
공업제품 중 석유류는 휘발유(7.2%), 경유(5.3%) 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6.3% 올랐다. 가공식품도 2.9% 상승했다.
서비스물가의 경우 전년 대비 2.1% 상승했다. 이 가운데 집세는 0.7%, 공공서비스는 0.8%, 외식은 3.0%,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는 2.9% 각각 상승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차이가 없지만, 환율이나 유류세 인하분 축소 영향이 있었다”며 “원재료나 인건비 등으로 통상 외식 물가는 일정 수준 상승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가격대를 차별화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출목적별로 기타 상품·서비스(4.1%), 음식·숙박(2.9%), 가정용품·가사서비스(2.3%), 교통(2.2%), 교육(2.1%), 주택·수도·전기·연료(2.0%), 식료품·비주류음료(2.0%), 의류·신발(2.0%), 보건(1.3%), 오락·문화(0.4%), 주류·담배(0.3%), 통신(0.1%) 등 모든 항목이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년 전보다 1.8% 상승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동일했다.
또 다른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도 114.12로 1년 전보다 1.9% 올랐다. 상승률은 전월보다 0.1%p 축소됐다.
전반적인 지표가 둔화한 가운데 소위 ‘밥상물가’ 지표는 품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소비자들이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물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6%로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높았다.
생선, 채소, 과일 등을 아우르는 신선식품지수는 신선과일이 5.4% 감소하면서 1년 전보다 1.4% 하락했다. 지난 2022년 3월(-2.1%) 이후 3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자신의 소유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여 얻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비용을 포함한 자가주거비포함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8% 상승했다.
-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6624달러… 1년 전보다 1.2%↑
- 30대 부동산 투자 이유 있었다… “고물가 경험하면 주택 구입 욕구 커져”
- “삼겹살은 못 참지”… 유통업계, 삼삼데이 맞아 기획전
- 작년 4분기 가계소득 522만원… 6개 분기 연속 늘었다
- 한은, 기준금리 연 3.00%→2.75%로… 한 달 만에 ‘스몰컷’ 재단행(종합)
- 자영업자 10명 중 7명 “1년 전보다 매출·순이익 감소했다”
- [그래픽] 소비자물가 추이 및 품목별 등락률
- 국민 10명 중 7명 “가계형편, 작년보다 나빠졌다”
- 배추보다 더 오른 ‘金양배추’… 한 포기 6000원 돌파
- KDI “美 관세 등 대외여건 급격 악화… 경기 하방 압력 확대”

